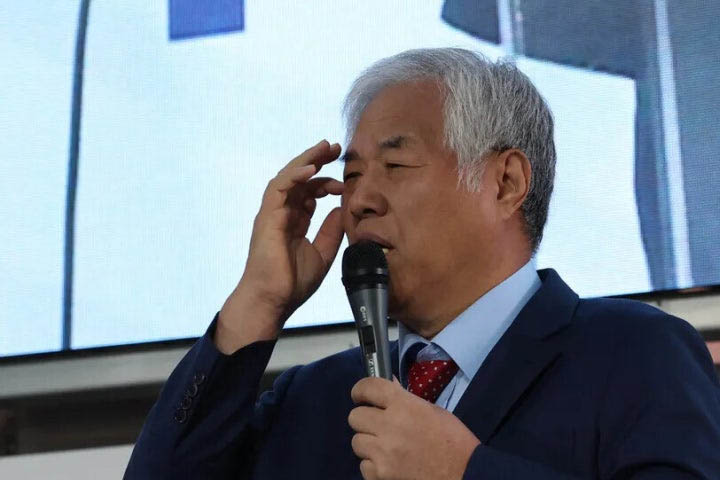30년 전, 스물두 살의 꽃다운 딸을 잃은 진옥자 씨(72)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해진 이 아크로비스타 건물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진 씨의 입에서 허망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록된 이 참사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이라는 비극적인 숫자를 남겼다.
30년 전, 스물두 살의 꽃다운 딸을 잃은 진옥자 씨(72)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해진 이 아크로비스타 건물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진 씨의 입에서 허망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록된 이 참사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이라는 비극적인 숫자를 남겼다.진 씨의 첫째 딸 정창숙 씨는 당시 백화점 지하 1층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분장사 자격증을 따고 유학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딸이었다. 퇴근길에 마시고 싶은 우유 한 잔 값을 아끼며 일기장에 기록할 만큼 알뜰하고 성실했던 딸은,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직후, 진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비극의 현장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위령탑이라도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는 외면당했다. 서울시는 보상금 마련을 명분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남의 노른자위 땅’은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다. 결국 참사의 기억을 간직할 위령탑 대신, 차가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위령탑은 참사 현장에서 무려 6km나 떨어진 양재시민공원에, 그것도 인근 지역의 거센 반대를 겨우 뚫고 나서야 겨우 세워질 수 있었다.

진 씨의 30년 세월은 끝나지 않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딸의 흔적이 묻혀 있을지 모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현 노을공원) 근처의 망원동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실종자 수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참사 보름 뒤, 붕괴 현장의 잔해물을 난지도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다. 1996년 서울시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전체 잔해의 99.6%에 달하는 3만 2699톤이 이곳에 버려졌다.
딸의 유품은커녕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진 씨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삽과 호미를 들고 쓰레기 더미로 향했다. 가족들은 악취와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잔해를 파헤쳤고, 유골로 추정되는 뼛조각 21점과 유류품 1140점을 직접 찾아냈다.
이제 고령이 된 진 씨와 유가족들의 마지막 남은 바람은 단 하나다.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이 뒤섞인 잔해가 묻혀 있는 노을공원에,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할 작은 추모비라도 세우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를 위해 유족들은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30년 묵은 외침은 ‘삼풍백화점 30년의 기다림, 노을공원에 표지석을 세워달라’는 문구에 담겨 있다.
©deskcontac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